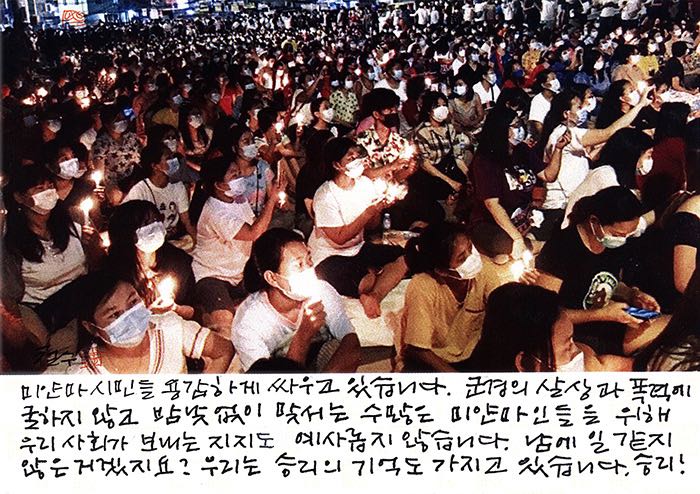신경숙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993년 4월
인간은 본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기쁨을 위시한 밝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슬픔인가? 그의 소설은 한없는 동감을 낳는다. 마음 맨 밑구석에 또아리틀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슬픔과 비애를 꼭꼭 끄집어 낸다. 그리고 그의 내면 세계와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것을 느끼며 동감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끝없는 동류의식은 내 맘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모조리 퍼올리는 마력이 있다. 인생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들인가?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다양한 만나과 헤어짐들, 죽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감정, 한 가지 느낌으로 모여드는가? '질경이 꽃이 너무 하얘서요' 젠장, 너무 하얗다니. 그래서 떠났다니. 심장에 물밀듯 파고드는 무너짐. 그 한마디에 못 담을 것이 무엇이랴. 하얘서 떠났고, 하얘서 버렸다. 천지가 온통 아득해진다.
신경숙의 힘은 문득 내 마음 속에 본래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는 그저 내것이라 여겨지는 감정들을 열심히 퍼올리는 두레박같은 존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