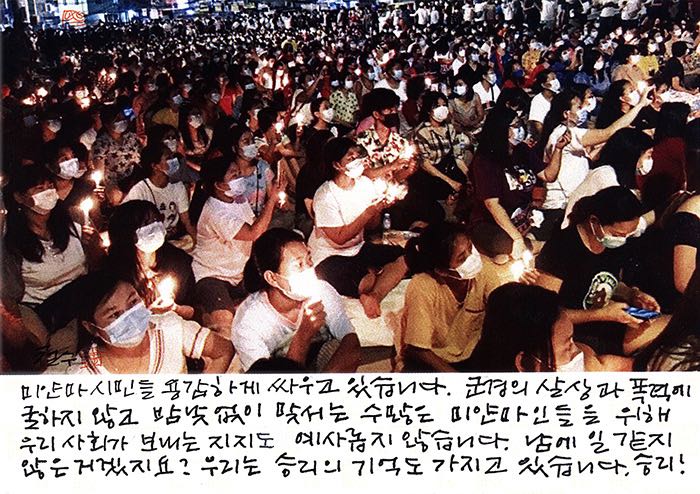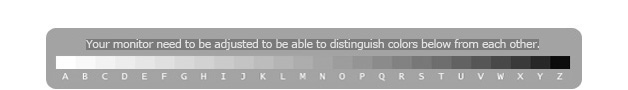맞춤검색
| 오즈 야스지로의 <태어나기는 했지만 (生まれてはみたけれど, 1932)> | 영화일기 |
조회수 97 | 스크랩 0 | |
 |
|
|
 |

맨날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보던...오즈.
차마 재미없을 것 같아 범접하지 못하던 차에...<태어나기는 했지만>을 보게 되었다.
1932년에 만든, 무성 영화.
하스미 시게히코가 '~ 한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달고 그것의 의미를 한껏 풀어 놓았던 오즈의 미학.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글쎄...한편의 영화를 보고, 그것도 한번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
한 편을 보고 그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건방일거구.
그를 알기보다는 그의 한 영화를 본 것으로 평해야겠지.
영화에서 오즈는 줄곧 어린이들의 시선을 내세운다.
카메라는 어린이의 키 높이에 맞춰져있고, 그래서 어른들은 화면을 위아래로 길게 채운다.
때때로 짤리다시피 한다.
바로 그 높이에서 오즈는 삶의 고단함과 때때로 어쩔 수 없음을 은근하게 그려낸다.
하지만 이 은근함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어린이들은 이 은근함 속에 감춰진 부조리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뱉어낸다.
'아빠는 훌륭하지 않아!'라고 소리칠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이들의 그런 반응 앞에서 어른은, 아빠는 당연하게 엉덩이를 때린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일까?
회사 중역에게 인사해야 좋지 않을까 라며 되묻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의 질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질서는 평화로움을 향해 나아간다.
아이들의 시선과 어른들의 시선은 상당히 격렬하지만,
오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 것 같다.
도리어 그것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겪어야 할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소소한 즐거움들과 신선함들.
오즈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에
<태어나기는 했지만>이 감당하지 못 할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으리라.
 | |
|
|
| http://blog.cine21.com/trb?11559 | | |
Late spring'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