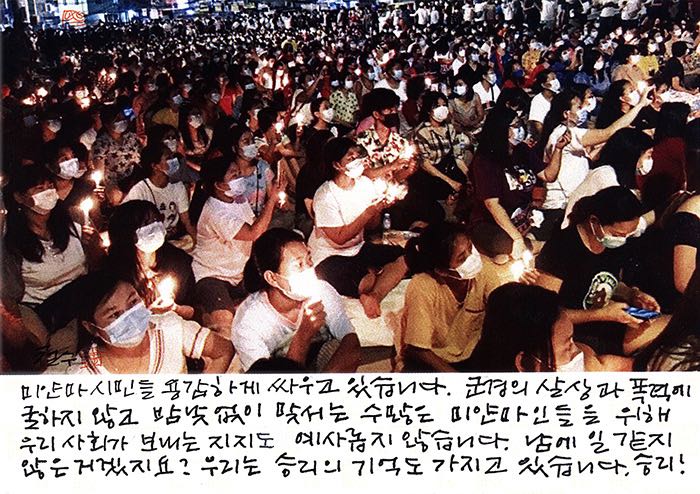카롤린 봉그랑 지음,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2000년 10월
콩스탕스는 발랄하다. 어느 날 문득 귀찮아진 남자 친구. 그의 요구가 점점 무례해진다고 느꼈겠지. 그러다가 그녀는 결국 혼자가 되었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버릇, 침대 위에 누워 책읽기를 여유롭게 가지려 한다. 그녀처럼 자기만의 버릇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가장 여유롭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
그녀가 처음 접한 밑줄은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였다. 책을 읽는 독자에게나 소설 속의 주인공에게나 얼마나 기대감을 심어주는 말인가? 차버린 남자 친구처럼 책읽기가 한참 지루해지고 있을 무렵, '더 좋은 것이 있다' 정말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책에서 발견하는 밑줄들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문장들이다. 하긴, 책에 적혀 있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사람에게 읽히기 좋은 형태와 문투로 자리잡혀 있겠지. 읽어줄 사람도 없는 책을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콩스탕스는 점점 밑줄에 관한한 박사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상상력이겠지. 이 밑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펜으로 그려졌을지를 똑똑히 상상해 내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기질이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그것은 작가가 밑줄을 긋는 습관일지도 모르겠지만.
콩스탕스는 자신의 농락당하고 있다고 느낄 무렵에 밑줄들에 대해 다시 조립해보고 분석해 보지만 결론은 아리송하다. 그러다 다시 접하는 밑줄들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어쩜 그렇게 잘 알까? 이 책에 그 문장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고 밑줄을 그었을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밑줄을 그었을까? 암튼, 그거야 중요하지 않겠지. 그녀가 지금 읽고 있는 밑줄이 자신에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 소설은 책은 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공작이다. 끊임없이 독자를 향해 열려있고,독자로 하여금 해석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반응하고, 책은 독자의 시선을 통해 존재의의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해석학적 순환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의 밑줄, 아탕뒤에 대한 해석까지 책을 읽으며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에 대해 마무리하며 소설을 마치고 있다. 작가에게 책은 끊임없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인 셈이다. 콩스탕스의 내면 속에 쉴 새없이 속삭이며, 그의 영혼을 갈망케 하는 밑줄들.
책에 밑줄을 긋는 습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긋고 있는 이 밑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읽힐지 생각해 본다면, 아무대나 아무 의미없이 밑줄을 긋진 않으리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밑줄을 그은 다음 다시 반추해 보고. 글읽기가 더욱 풍성해 질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책을 읽은 후로 오히려 더 많은 줄을 긋게 되었다. 책은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조금밖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같아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