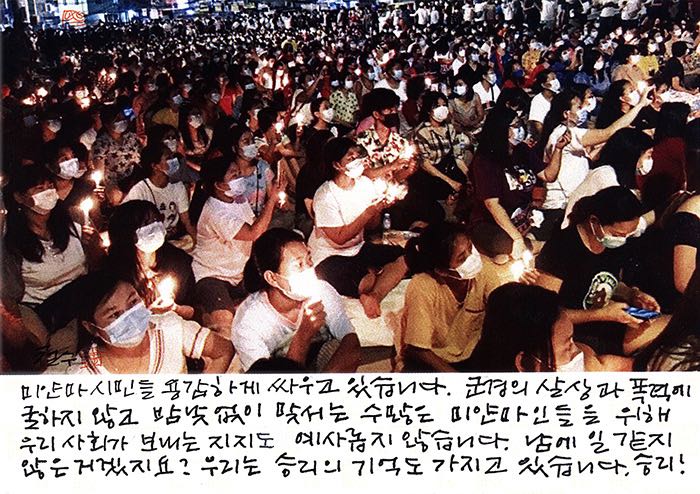공지영 지음 / 김영사 / 2001년 7월
오래 전에 사두었던 책을 이제서야 읽어보았다. 내 방에 함께 사는 동료가 추석에 집에 갔다 오면서 내 책을 스을쩍해서 먼저 읽은 것이 조금 마음에 남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책장에 내 책이 꽂혀 있었다. 얼른 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간 남들 때묻은 책을 읽을 것 같아서...
책을 읽는 내내 이제 갖 접어든 30대라는 자리를 돌아보았다. 영혼의 사춘기 정도로 30대를 이야기하는 신경숙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20대 초중반에 가졌던 열정들과 믿음들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고민들이 꼬리를 문다. 작가가 겪었던 30대는 또 무엇이었을까?
출판사의 기획으로 출발한 공지영씨의 수도원 기행기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걸까 하는 의문이 종종 들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야기들이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여러 이야기들과 감정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때문이었다. 수도원의 역사, 위치, 내력이 뭐가 중요한 것이겠는가? 수도원을 기행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새로움과 여러 느낌들을 받았다면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사는 거 별거 아냐, 사는데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 그러면 너만 자꾸 다쳐'에서 출발하는 그의 수도원 기행은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아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로 마치고 있다.
아르정탱을 거쳐 솔렘 수도원, 베네딕트 남자 봉쇄 수도원, 테제 공동체, 오뜨리브 수도원, 마그로지 여자 시토 봉쇄 수도회, 킴지의 수도원, 오스나 브뤽 베네딕트 여자 봉쇄 수도원, 몽포뢰 수도원, 림부르크 수도원. 그가 거쳐간 이 수도원들이 한결같이 풍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애로움으로 느껴졌다.
산사에 머리를 깍고 출가하는 스님들이 다 이 세상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어렸을 적 생각처럼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들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봉쇄 수도원에서 평생을 기도와 노동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 갔다기 보다는 그 길까지 오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으리라. 작가는 그렇게 썼다. 신께서 불러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였다. 조용한 성당에 앉아 있다가 나는 알아버린 것이다. 그건 그저 그냥, 사랑이었다는 걸.
작가는 수도원 기행 내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항복한 것이 어째서 행복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복합니다. 절대자 앞에 삶을 내려 놓았을 때 밀려드는 행복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앞에 나아갈 필요가 무엇이랴. 18년 동안 내내 무거운 짐을 고달펐다면, 이제는 자유하리라. 봉쇄 수도원 안에서 봉쇄된 그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내 삶에 유폐된 채 우리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에 대한 무너짐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던 것들과의 결별일 뿐이다.
혹여 죽어도 용서못할 사람이 있다면, 죽도록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작가가 간 길들을 생각해 보시길. 쓰러지고 싶고, 삶을 그만 놔 버리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읽어보시길. 아마도 그들이, 봉쇄된 공간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귀가를 맴돌게 될 것이다. 'c'est un miracle!' (그것이 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