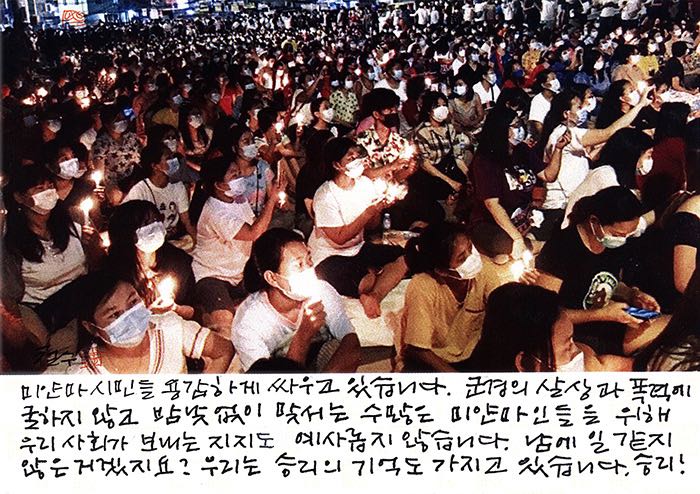황석영 지음 / 창비(창작과비평사) / 2001년 6월
활자를 머릿속의 이미지로 떠올리고,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인지 몰랐다. 책을 읽는 내내 생각하는 것을 그만 두고 싶었다. 눈 앞에 읽혀지는 것들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아무런 의미 없이 박혀 있는 활자였으면 좋겠다며 어렵게 어렵게 페이지를 넘겨갔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라든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흉한 적병과' 같은 찬송가들을 힘차게 부르고 있다.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부르짖던 십자군이 인류의 문명을 얼마나 욕되게 했던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곳, 반도의 북쪽에서 일어났던 이 처참함을 무엇이라 이야기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형님은 죄인입니다.'라고 신천 학살극의 한 주인공인 류요한의 동생 류요섭 목사는 적는다. 신천에서 일어난 일이 피차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었기에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수와 학살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류요섭 목사는 자신의 형이 한 일들, 기독교인들이 벌인 학살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한다. 정작 이 땅위에서 친일파와 독재다들과 죄인들은 입을 다물고 잘 살아가고 있고, 누구하나 탓하지도 않는 묵인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것일까?' 류요한의 아내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구역질나는 혹독한 죽음의 행진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녕 하나님은 눈을 감아 버렸던가? 빨갱이들을 때려 잡기 위해 거사를 벌이기 전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악의 무리를 말끔히 없애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일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되어 갈 때, 유태인들 역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외쳤다.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입맛에 따라 이용해 버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신물이 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황해도 진지노귀굿의 열두 마당을 기본 얼개로 썼다고 한다. 굿판에서처럼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등장하고, 회상하고, 이야기도 제각각인 형식을 빌어서 썼다. 때때로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 간 일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부각된다. 역사적으로 경험한 일은 분명히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긴다는 것. 죽게 되면 죽은 자들은 서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화해의 시도가 될 수는 없을까?
'이 백당놈우 새끼럴!
나는 이제 우리의 편먹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사탄을 멸하는 주의 십자군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했고 믿음도 타락했다고 생각했다.' 류요한은 눈빛을 잃어버린 나날이 되어갔다. '사는 게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랬다. 조금만 짜증이 나면 에이 썅, 하고 짧게 씹어뱉고 나서 상대를 죽여버렸다.'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오만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 세상에 시도된 그 모든 범죄 행위들의 바탕엔 기독교이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사람의 잔인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손님이라고 이름 붙인 기독교나 사회주의는 그 잔인한 인간의 바탕을 조금이라도 가리워 보고픈 인간의 욕망일 뿐인가? 도대체 나는 어느 곳에 내 사상적 뿌리를 박고 민족적 자존심을 찾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