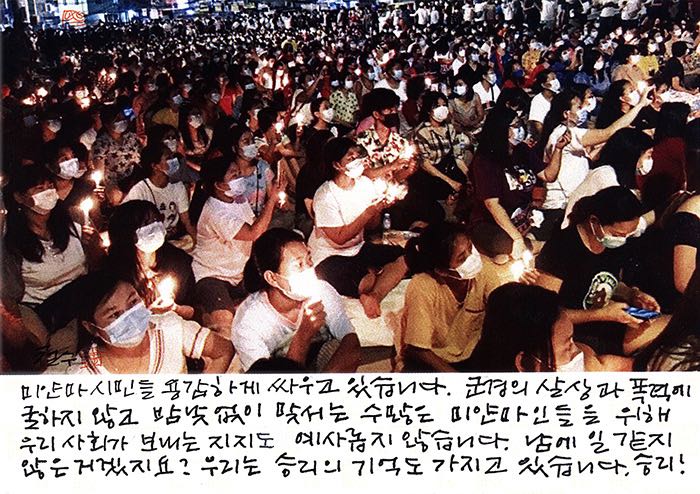왠 방정일까? 이 책을 속초까지 가서, 비 오는 날 서점을 찾아 뛰어다니며 사서 아주 재미있게 읽어놓고, 불현듯 씹고 싶어졌다.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인가? 하긴, 조금 있으면 스님들과 불자들이 잠자리를 거두고 예불을 올릴 시간이니까, 내 시간으로는 늦디 늦은 시간. 자고 싶은 시간.
저 변산반도의 사타구니 곰소항에 가면
바다로부터 등 돌린 폐선들,
나는 그 낡은 배들이 뭍으로 기어오르고 싶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시집을 내고 받은 인세를 모아서
바다에 발 묶인 배 한 척을 샀던 것이다...-낭만주의 중-
시를 읽는 시간에 자신을 투자할 줄 모르는 인간하고는 놀지 않겠다고 시인은 벼르지만, 지금 변산은 전투중이다.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간척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무슨 무슨 효과와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변가에는 장승들이 모진 바닷바람에 맞서 서 있고, 사람들은 바다를 망치기로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배를 몰아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기 전에,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곳으로 변하고 있는 그 곳에는 한 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천연덕스럽게, 낭만적으로, 낭만주의인지 정신의 넝마주의인지는 모르고 죽어가는 바다 앞에 시 읽을 줄 아는 것을 논하는 것은 내게 불쾌하다. 시인의 말처럼 놀지 않겠다, 절교다!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 한 일이 있다면
소낙비같이 허둥대며 뛰어다닌 일
그리하여 세상의 바짓가랑이에 흙탕물 튀게 한 일
씨발, 세상의 입에서 욕 튀어나오게 한 일
.....
시절은 갔다, 라고 쓸 때
그 때가 바야흐로 마흔 살이다
....나에게는 / 나에게는 이제 외로운 일 좀 있어도 좋겠다 -마흔 살 중에서-
왜 여기서는 <서른, 잔치가 끝났다>가 생각이 나는걸까? 시인보다 열살쯤 나이가 어리니, 그가 세상에 씨발이라는 욕이 튀어나오게 했다면, 나는 '씨'정도는 나오게 했을까? 허둥대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그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일까? 바야흐로 마흔 살이 되었고 꾸역꾸역 나한테 명함 건넨 자들의 이름을 모두 삭제하고 싶다고 시인은 적는다. 그 명함들이란 뭘까? 그에게 씨발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것일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일까? 그가 지금 외로워지고 싶은 이유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일까? 지난 잔치는 이제 다 치우고 새로운 잔치를 벌이고 싶다는 것인지..
그의 시집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다. 그의 시집은 장중해야 한다. 예민하고 우리 살갗을 적시는 언어는 똑같았지만, 언어 속에 담긴 깊고 깊은 고민과 투쟁은 없다. 그가, 이제 잔치를 그만 두고 싶은걸까?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무슨 무슨 주의자로 남고 싶은 것일까?